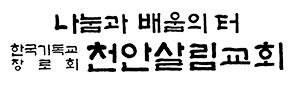용산참사 희생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9-11-16 15:18
조회
2751
*<복음과 상황> 2009년 12월호 원고입니다.
용산참사 희생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1.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해 벽두에 벌어진 용산참사로 숨을 거둔 희생자들의 주검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이르기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싸늘한 냉동고에 머물고 있다. 억울한 유족들의 눈물은 마를 겨를이 없다. 불난 집에 또 불을 지르는 격으로 법원의 판결마저도 그 억울함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 참사로 희생당한 아버지의 아들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빚어진 참사를 규명하려는 의도는 애초 보이지 않는 판결이었다.
비극의 참사가 사실상 예견되었듯이 그 참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 또한 어쩌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헤아릴 수 있는 공권력이라면 애초 참사를 일으킬 만큼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지 않을 터이기에 말이다. 결국 거주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개발정책과, 이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무리한 진압과 그로 인한 참사, 그리고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만을 옹호하는 법적 판결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정된 수순 가운데 있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하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뻔한 비극적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통 받는 이들의 눈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한 삶의 구조가 빚어내는 비극이다.
그나마 다행일까? 용산참사가 말해주는 삶의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래도 그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하며 눈물짓는 이들의 발길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다. 아직도 그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도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굴러가고 있지만, 그 발길들은 그래도 그렇게 굴러가는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눈물짓는 그 발길들은 우리 사회에 억울한 죽음들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소망마저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에 다행이다. 찬바람 몰아치는 추위 가운데서 시작된 그 발걸음은 뙤약볕과 비바람이 내리치는 계절을 지나 다시 찬바람이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짓는 발길들을 보며 성서 가운데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다(누가복음 23: 26~31). 끔찍한 사형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니 그 자체로 비감한 장면일 수밖에 없다. 이 장면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등장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향하여 가던 당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그는 무명의 한 필부였을 것이다. 그 구경꾼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 갑자기 불려나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전해 준다. 스스로 매어야 할 십자가도 스스로 질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가는 발걸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헤아리며 들여다보면 당연스럽게 그 다음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무리를 지어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예수를 보고 짓는 통곡이었다. 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였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갈릴리의 여자들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일러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그 지역, 곧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 당시 죄인이 처형될 때 여자들의 통곡은 일종의 종교적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지나는 것만은 아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를 보고 흘린 눈물은 구경꾼들마저도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그 죽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작은 틈새와도 같은 것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현실이 아직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수께서는 통곡하는 여인들을 보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쉽게 헤아리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장차 여러분들이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가볍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장차 일어날 일을 대비하십시오.’ 하는 뜻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복되다는 이야기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 희망에 이르는 과정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산이 무너져 내리라고 외치고 언덕이 덮어지라고 외치는 것은 재난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말한다(호세아 10:8 참조).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고 나서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은 재난의 무서움을 말한다. 푸른 가지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면 마른 가지에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는가? 장차 일어날 엄청난 일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는 이야기는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굳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고 했을까?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공감한 이들에게 그 마음이 부질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접으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지금 나를 보고 울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 보고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다. 장차 일어날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선포가 겨냥하는 뜻은 사실 바로 그 현재 시점에 있다. 지금 자신의 코앞에서 보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곧 지금 자신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이다.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누군가가 부조리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가능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타인의 고통에 아예 눈길을 돌릴 수 없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마음의 비정함을 뜻한다. 무심함이다. 그 무심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라면 따뜻한 온기가 자리할 틈이 없고 따라서 희망 자체가 없는 셈이다. 비정한 권력은 사람들 사이의 그 무심함 가운데 터를 잡고 그 희망 없음을 양식으로 삼는다. 어쩌면 한 해가 다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에 그 무심함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소수의 발길일지언정 그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 곁에서 함께 눈물짓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 그것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표할 때마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 고통을 타인의 문제로만 여긴다면 그 역시 문제다. 거기에서 자선을 베푸는 도덕주의자의 위선과 허위의식이 자리한다. 선민의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고통에의 공감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이의 동정에 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현실을 넘어서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
용산참사, 그것은 용산 그 재개발지에 살았던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참사를 일으킨 폭력적 개발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성장주의를 당연시하는 사회 안에 사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효율성 기치 아래 겪는 실직의 위협과 비정규직의 현실, 경쟁의 대열로만 치닫고 있는 교육의 현실은 그 자체로 ‘용산참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살아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비극이 자신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교회는 스스로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자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가 이미 맞부딪히고 있는 비극적 현실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 진실을 자각하고 있을 때 비극적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희망 또한 자리할 것이다.*
용산참사 희생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최형묵(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1.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해 벽두에 벌어진 용산참사로 숨을 거둔 희생자들의 주검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이르기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싸늘한 냉동고에 머물고 있다. 억울한 유족들의 눈물은 마를 겨를이 없다. 불난 집에 또 불을 지르는 격으로 법원의 판결마저도 그 억울함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 참사로 희생당한 아버지의 아들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공권력의 투입으로 빚어진 참사를 규명하려는 의도는 애초 보이지 않는 판결이었다.
비극의 참사가 사실상 예견되었듯이 그 참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 또한 어쩌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헤아릴 수 있는 공권력이라면 애초 참사를 일으킬 만큼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지 않을 터이기에 말이다. 결국 거주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개발정책과, 이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무리한 진압과 그로 인한 참사, 그리고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만을 옹호하는 법적 판결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정된 수순 가운데 있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하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뻔한 비극적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통 받는 이들의 눈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한 삶의 구조가 빚어내는 비극이다.
그나마 다행일까? 용산참사가 말해주는 삶의 현실은 참담하지만, 그래도 그 억울한 이들과 함께 하며 눈물짓는 이들의 발길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다. 아직도 그 희생자들이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도 세상은 아무 일 없는 듯이 굴러가고 있지만, 그 발길들은 그래도 그렇게 굴러가는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눈물짓는 그 발길들은 우리 사회에 억울한 죽음들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와 소망마저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에 다행이다. 찬바람 몰아치는 추위 가운데서 시작된 그 발걸음은 뙤약볕과 비바람이 내리치는 계절을 지나 다시 찬바람이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과 함께 눈물짓는 발길들을 보며 성서 가운데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다(누가복음 23: 26~31). 끔찍한 사형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장면이니 그 자체로 비감한 장면일 수밖에 없다. 이 장면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다.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등장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향하여 가던 당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그는 무명의 한 필부였을 것이다. 그 구경꾼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이 갑자기 불려나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전해 준다. 스스로 매어야 할 십자가도 스스로 질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가는 발걸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헤아리며 들여다보면 당연스럽게 그 다음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무리를 지어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예수를 보고 짓는 통곡이었다. 대체 이 여자들은 누구였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평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갈릴리의 여자들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일러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은 그 지역, 곧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 당시 죄인이 처형될 때 여자들의 통곡은 일종의 종교적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에 지나는 것만은 아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를 보고 흘린 눈물은 구경꾼들마저도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그 죽임의 공모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작은 틈새와도 같은 것이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현실이 아직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예수께서는 통곡하는 여인들을 보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쉽게 헤아리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장차 여러분들이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차라리 가볍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장차 일어날 일을 대비하십시오.’ 하는 뜻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하다.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오히려 복되다는 이야기는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 희망에 이르는 과정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산이 무너져 내리라고 외치고 언덕이 덮어지라고 외치는 것은 재난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말한다(호세아 10:8 참조).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고 나서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은 재난의 무서움을 말한다. 푸른 가지에 불이 붙을 수 있다면 마른 가지에는 얼마나 더 잘 붙겠는가? 장차 일어날 엄청난 일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는 이야기는 그 재난으로 인한 고통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굳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고 했을까?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열고 공감한 이들에게 그 마음이 부질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접으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지금 나를 보고 울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 보고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다. 장차 일어날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선포가 겨냥하는 뜻은 사실 바로 그 현재 시점에 있다. 지금 자신의 코앞에서 보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곧 지금 자신의 현실이라는 이야기이다.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누군가가 부조리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가능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타인의 고통에 아예 눈길을 돌릴 수 없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 그것은 그 마음의 비정함을 뜻한다. 무심함이다. 그 무심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라면 따뜻한 온기가 자리할 틈이 없고 따라서 희망 자체가 없는 셈이다. 비정한 권력은 사람들 사이의 그 무심함 가운데 터를 잡고 그 희망 없음을 양식으로 삼는다. 어쩌면 한 해가 다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에 그 무심함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소수의 발길일지언정 그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 곁에서 함께 눈물짓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 그것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표할 때마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 고통을 타인의 문제로만 여긴다면 그 역시 문제다. 거기에서 자선을 베푸는 도덕주의자의 위선과 허위의식이 자리한다. 선민의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고통에의 공감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이의 동정에 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동시에 그 현실을 넘어서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
용산참사, 그것은 용산 그 재개발지에 살았던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참사를 일으킨 폭력적 개발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성장주의를 당연시하는 사회 안에 사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효율성 기치 아래 겪는 실직의 위협과 비정규직의 현실, 경쟁의 대열로만 치닫고 있는 교육의 현실은 그 자체로 ‘용산참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살아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 비극이 자신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교회는 스스로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자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가 이미 맞부딪히고 있는 비극적 현실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 진실을 자각하고 있을 때 비극적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희망 또한 자리할 것이다.*
전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