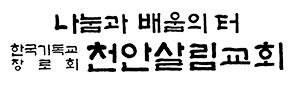설날의 추억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8-02-10 19:35
조회
3376
* <주간 기독교> 목회단상 64번째 원고입니다(080210).
설날의 추억
명절이면 늘 큰집을 찾는다. 지금은 차로 몇 시간 달려 형님 집을 찾지만, 어릴 때 설날 아침이면 바로 한 집 건너 있는 큰집을 찾았다. 우리 집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할머니가 계시고 큰 아버지가 계시니 큰집이 된 그 집 따뜻한 안방에 다닥다닥 모여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렸던 풍경은 지금도 설날이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장면이다. 게다가 친척들이 거의 한 동네에 살아 친형제 사촌형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집집을 순회하며 세배를 드렸던 기억 역시 생생하다.
물론 그렇게 순회하고 나면 두둑해진 세뱃돈 주머니가 큰 기쁨이었다. 어른들은 대개 빳빳한 100원짜리 지폐나 50원짜리 지폐로 세뱃돈을 줬는데, 자녀를 ‘한 다스’ 둔 짠돌이 장로님 아저씨는 반짝반짝 빛나는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주며 허허 웃기도 했다. ‘엥, 이게 웬 동전이야?’ 지폐로만 세뱃돈을 받던 형제들은 잠시 한순간 속으로 실망감을 갖기도 했지만, 대수는 아니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받았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다들 세뱃돈 주머니는 두둑해졌으니까.
모처럼 때때옷을 입고 온갖 맛있는 것을 먹으며 온종일 와글와글했던 명절 풍경은 지금도 선하다. 그것은 어울려 사는 일의 기쁨,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오늘날 명절이면 더 쓸쓸하고 더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가 살아 있던 시절에는 비단 혈연으로 얽힌 가족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과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관습들이 있었다. 명절이면 피붙이가 아니라도 일부러 가난한 집에 맛있는 음식 한 접시라도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 부랑인이라도 잔칫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새 상을 내놓는 것을 예의로 여겼고, 밤중에 집을 찾으면 사연을 묻지 않고 잠을 재워 보내는 풍경도 흔했다. 그 모든 것이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그 옛 풍경을 떠올려 보는 것은, 단순히 복고적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옛날이라고 해서 어찌 아픔이 없었을까? 오히려 일상적으로 누군가는 겪었었을 수 있는 더 큰 쓸쓸함과 더 큰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삶의 풍경들이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가깝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로만 얽힌 오늘 삶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다.
오로지 능력만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고, 이해관계로만 똘똘 뭉치는 삶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게 오늘 현실이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찾는 빈도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은 빛바랜 과거에 대한 향수일 수만은 없다.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한 소망이 아닐까?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설날의 추억
명절이면 늘 큰집을 찾는다. 지금은 차로 몇 시간 달려 형님 집을 찾지만, 어릴 때 설날 아침이면 바로 한 집 건너 있는 큰집을 찾았다. 우리 집보다 훨씬 작은 집이었지만 할머니가 계시고 큰 아버지가 계시니 큰집이 된 그 집 따뜻한 안방에 다닥다닥 모여 떡국을 먹고 세배를 드렸던 풍경은 지금도 설날이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장면이다. 게다가 친척들이 거의 한 동네에 살아 친형제 사촌형제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집집을 순회하며 세배를 드렸던 기억 역시 생생하다.
물론 그렇게 순회하고 나면 두둑해진 세뱃돈 주머니가 큰 기쁨이었다. 어른들은 대개 빳빳한 100원짜리 지폐나 50원짜리 지폐로 세뱃돈을 줬는데, 자녀를 ‘한 다스’ 둔 짠돌이 장로님 아저씨는 반짝반짝 빛나는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주며 허허 웃기도 했다. ‘엥, 이게 웬 동전이야?’ 지폐로만 세뱃돈을 받던 형제들은 잠시 한순간 속으로 실망감을 갖기도 했지만, 대수는 아니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받았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다들 세뱃돈 주머니는 두둑해졌으니까.
모처럼 때때옷을 입고 온갖 맛있는 것을 먹으며 온종일 와글와글했던 명절 풍경은 지금도 선하다. 그것은 어울려 사는 일의 기쁨,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오늘날 명절이면 더 쓸쓸하고 더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적 유대가 살아 있던 시절에는 비단 혈연으로 얽힌 가족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과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관습들이 있었다. 명절이면 피붙이가 아니라도 일부러 가난한 집에 맛있는 음식 한 접시라도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 부랑인이라도 잔칫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새 상을 내놓는 것을 예의로 여겼고, 밤중에 집을 찾으면 사연을 묻지 않고 잠을 재워 보내는 풍경도 흔했다. 그 모든 것이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그 옛 풍경을 떠올려 보는 것은, 단순히 복고적 회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옛날이라고 해서 어찌 아픔이 없었을까? 오히려 일상적으로 누군가는 겪었었을 수 있는 더 큰 쓸쓸함과 더 큰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삶의 풍경들이 피부로 와 닿을 만큼 가깝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로만 얽힌 오늘 삶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다.
오로지 능력만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고, 이해관계로만 똘똘 뭉치는 삶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게 오늘 현실이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찾는 빈도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은 빛바랜 과거에 대한 향수일 수만은 없다. 바로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한 소망이 아닐까?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전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