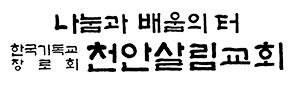아픈 고백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6-02-01 12:21
조회
3154
* <주간 기독교> 목회단상 33번째 원고입니다(060131)
아픈 고백
목회를 하다 보면 어찌 자랑하고 싶은 일, 기쁜 일만 있을까? 오히려 가리고 싶은 일, 마음 아픈 일이 더 많다. 삶 자체 그런 것 아닐까? 천 가지 아픈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기쁜 일로 아픔을 상쇄하며 살아가는 게 삶이라고도 하는 걸 보면, 그게 우리 삶의 실상인 것 같다.
아픈 고백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거창해졌다. 사실 아픈 고백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새해 벽두에 묘한 편지를 하나 받았다. 교회로 전달된 편지 봉투에는 번지수도 없이 그저 어느 골목에 있는 어느 교회라는 식으로 수신처가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수신자는 내 이름으로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고 발신자의 이름도 또렷했다. 그런데 발신처 주소가 또 묘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과는 연고가 없는 지역의 사서함 번호였다.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곧바로 직감되는 바가 있었으나, 우선 급히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나갔다.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주였지만,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암시적인 내용일 뿐 딱 짚어 말하지는 않았다. 수소문을 해보니 예감했던 대로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처음 편지를 받아든 순간 이미 띵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러니까 지난해 어느 날 애써 찾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되었다. 띄엄띄엄이기는 해도 몇 주간 교회에 나왔던 이라 처음에는 몇 차례 계속 연락을 취해 보았다. 그러나 아예 두절이라 별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사연을 알 수 없어 궁금해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스쳐 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기도 했다. 사실 그렇게 스쳐간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니까. 그렇게 무심해져 있는 터에 연락을 받았으니 띵해졌을 수밖에.
곧 날을 잡아 면회를 하였다. 자초지종을 듣자니 술기운에 말다툼을 벌인 게 그리되었다 한다. 잘 하면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법한 죄과에 비하면 무거운 형을 받고 있었다. 일이 터졌을 때 곧바로 연락을 하지 그랬느냐고 큰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의 무심함에 대한 자책이 더 컸다. 일이 그렇게 된 연후에야 주변 사람을 수소문해 파란 많은 그의 인생역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팠다. 어쩌면 그야말로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심정으로 품에 안겼던 셈인데, 정말 무심했다 싶었다.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면 인생의 갈피를 잡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였는데, 말로는 늘 눈길을 받지 않는 곳에 더 눈길을 주자고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울타리에 들어온 이에 대해서마저 그렇게 무심했던가 싶었다.
아픈 고백을 하자면 이 뿐일까? 아무튼 새해 벽두부터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 진짜 목사로 더 철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아픈 고백
목회를 하다 보면 어찌 자랑하고 싶은 일, 기쁜 일만 있을까? 오히려 가리고 싶은 일, 마음 아픈 일이 더 많다. 삶 자체 그런 것 아닐까? 천 가지 아픈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기쁜 일로 아픔을 상쇄하며 살아가는 게 삶이라고도 하는 걸 보면, 그게 우리 삶의 실상인 것 같다.
아픈 고백을 하나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거창해졌다. 사실 아픈 고백이라기보다는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새해 벽두에 묘한 편지를 하나 받았다. 교회로 전달된 편지 봉투에는 번지수도 없이 그저 어느 골목에 있는 어느 교회라는 식으로 수신처가 기록되어 있었다. 물론 수신자는 내 이름으로 또렷이 기록되어 있었고 발신자의 이름도 또렷했다. 그런데 발신처 주소가 또 묘했다. 내가 기억하는 그 이름의 주인공과는 연고가 없는 지역의 사서함 번호였다.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곧바로 직감되는 바가 있었으나, 우선 급히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나갔다.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주였지만, 자신의 근황을 전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암시적인 내용일 뿐 딱 짚어 말하지는 않았다. 수소문을 해보니 예감했던 대로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처음 편지를 받아든 순간 이미 띵했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러니까 지난해 어느 날 애써 찾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두절되었다. 띄엄띄엄이기는 해도 몇 주간 교회에 나왔던 이라 처음에는 몇 차례 계속 연락을 취해 보았다. 그러나 아예 두절이라 별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사연을 알 수 없어 궁금해 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스쳐 간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기도 했다. 사실 그렇게 스쳐간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니까. 그렇게 무심해져 있는 터에 연락을 받았으니 띵해졌을 수밖에.
곧 날을 잡아 면회를 하였다. 자초지종을 듣자니 술기운에 말다툼을 벌인 게 그리되었다 한다. 잘 하면 훈방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법한 죄과에 비하면 무거운 형을 받고 있었다. 일이 터졌을 때 곧바로 연락을 하지 그랬느냐고 큰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의 무심함에 대한 자책이 더 컸다. 일이 그렇게 된 연후에야 주변 사람을 수소문해 파란 많은 그의 인생역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팠다. 어쩌면 그야말로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심정으로 품에 안겼던 셈인데, 정말 무심했다 싶었다. 말 그대로 신앙이 아니면 인생의 갈피를 잡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였는데, 말로는 늘 눈길을 받지 않는 곳에 더 눈길을 주자고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울타리에 들어온 이에 대해서마저 그렇게 무심했던가 싶었다.
아픈 고백을 하자면 이 뿐일까? 아무튼 새해 벽두부터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 진짜 목사로 더 철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전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