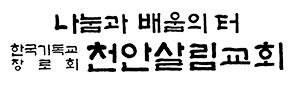길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5-08-04 13:00
조회
2921
* <주간 기독교> 목회단상 스물 세번째 원고입니다(050804).
길
이거 좀 불공평하다 싶다. 누군 휴가 때문에 빨리 원고를 달라고 다그치고, 누군 휴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써내야 하니 말이다. 그래도 감내하기로 했다. 한 길로만 통하지 않는 세상사 이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가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났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휴가라는 걸 따로 챙길 겨를이 없었다. 교회의 각급 수련회를 챙기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캠프다 뭐다 바빴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법 머리가 커지면서 호젓한 가족만의 휴가를 원했다. 그래서 몇 해전부터는 꼬박꼬박 가족여행을 야무지게 챙기기 시작했고 올해도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행선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목적지만 있었다. 큰 녀석 진학상담을 위해 담양의 대안학교를 들르고 그 동네에 신선처럼 사는 친구 목사집에 잠시 들러 차 한잔을 나눈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바람 따라 길 따라 나서는 길이었다. 퍼부어 대는 빗줄기가 예사롭지 않았지만 길은 막힘이 없었다. 그렇게 나선 길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었다. 흘러흘러 당도한 곳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마주치는 화개 장터, 그리고 아마도 봄날이었다면 가장 아름다울 벚꽃 가로수길 따라 깊숙이 자리한 쌍계사 계곡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로 맑은 계곡 물은 요동치는 듯했지만, 절경의 산수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 수 없었다.
단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 행선지는 소설 토지의 무대 하동 평사리였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갈거나? 아예 남해바다로 돌릴거나, 낙동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거나? 내륙일주 삼아 북상길로 안동 도산서원을 들르기로 했다. 도산서원에서 하회마을을 거쳐 그 다음은 문경새재 지나 집으로 향할 참이었다. 그런데 착오가 생겼다. 천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 도산서원에 정말 마당쇠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렸던 길인데, 다 왔다 싶은 길목에서 확인한 것은 도산서원이 아니라 고산서원이었다. 도산서원은 저 북쪽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려는데, 아직도 몇 십 킬로 더 남았단다. 구불구불 고갯길 산길을 넘어 들어가니 어느 대목에서부터 태백 이정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 그 고갯길 산길 오르고 내리고 돌고 돌아 가까스로 문닫기 전에 당도했다. 도산서원에는 과연 '마당쇠'가 있었다. 열쇠꾸러미를 든 마당쇠는 잠시후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
대학자 퇴계 선생의 숨결이 배인 그 현장을 목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지만, 정작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길이었다. 숨가쁘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 길의 의미가 더욱 실감되었는지도 모른다. 퇴계 선생에게야 그 본가가 근처에 있으니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 별 대수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굽이굽이 외진 길을 따라 스승을 찾아 나섰던 선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은 굽고 험한 길이라도 포장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비탈길뿐이었으리라. 이미 나 있던 길도 아니고, 아마도 길을 내면서 찾아 나섰을 성싶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길을 만들었던 선인들의 체취를 맛보는 듯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닐까?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길
이거 좀 불공평하다 싶다. 누군 휴가 때문에 빨리 원고를 달라고 다그치고, 누군 휴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써내야 하니 말이다. 그래도 감내하기로 했다. 한 길로만 통하지 않는 세상사 이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휴가를 맞아 가족여행을 떠났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휴가라는 걸 따로 챙길 겨를이 없었다. 교회의 각급 수련회를 챙기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캠프다 뭐다 바빴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법 머리가 커지면서 호젓한 가족만의 휴가를 원했다. 그래서 몇 해전부터는 꼬박꼬박 가족여행을 야무지게 챙기기 시작했고 올해도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
이번에는 행선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첫 번째 목적지만 있었다. 큰 녀석 진학상담을 위해 담양의 대안학교를 들르고 그 동네에 신선처럼 사는 친구 목사집에 잠시 들러 차 한잔을 나눈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바람 따라 길 따라 나서는 길이었다. 퍼부어 대는 빗줄기가 예사롭지 않았지만 길은 막힘이 없었다. 그렇게 나선 길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었다. 흘러흘러 당도한 곳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마주치는 화개 장터, 그리고 아마도 봄날이었다면 가장 아름다울 벚꽃 가로수길 따라 깊숙이 자리한 쌍계사 계곡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로 맑은 계곡 물은 요동치는 듯했지만, 절경의 산수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 수 없었다.
단잠을 자고 일어나 다음 행선지는 소설 토지의 무대 하동 평사리였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갈거나? 아예 남해바다로 돌릴거나, 낙동강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거나? 내륙일주 삼아 북상길로 안동 도산서원을 들르기로 했다. 도산서원에서 하회마을을 거쳐 그 다음은 문경새재 지나 집으로 향할 참이었다. 그런데 착오가 생겼다. 천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 도산서원에 정말 마당쇠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렸던 길인데, 다 왔다 싶은 길목에서 확인한 것은 도산서원이 아니라 고산서원이었다. 도산서원은 저 북쪽 한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려는데, 아직도 몇 십 킬로 더 남았단다. 구불구불 고갯길 산길을 넘어 들어가니 어느 대목에서부터 태백 이정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 그 고갯길 산길 오르고 내리고 돌고 돌아 가까스로 문닫기 전에 당도했다. 도산서원에는 과연 '마당쇠'가 있었다. 열쇠꾸러미를 든 마당쇠는 잠시후면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다.
대학자 퇴계 선생의 숨결이 배인 그 현장을 목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지만, 정작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길이었다. 숨가쁘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절박감 때문에 그 길의 의미가 더욱 실감되었는지도 모른다. 퇴계 선생에게야 그 본가가 근처에 있으니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 별 대수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굽이굽이 외진 길을 따라 스승을 찾아 나섰던 선비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은 굽고 험한 길이라도 포장되어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비탈길뿐이었으리라. 이미 나 있던 길도 아니고, 아마도 길을 내면서 찾아 나섰을 성싶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내딛음으로써 길을 만들었던 선인들의 체취를 맛보는 듯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닐까?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전체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