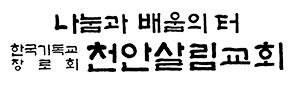형형색색 모자이크의 나라
작성자
최형묵
작성일
2007-06-17 22:42
조회
4404
* <주간 기독교> 목회단상 57번째 원고입니다(070617)
형형색색 모자이크의 나라
별 재간은 없지만 그저 하는 일 하다 보니 바깥나라 나들이도 심심치 않다. 캐나다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협의회차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달 말 캐나다를 방문했다. “제국 상황에서의 선교”라는 무거운 주제발표 과제를 안고서 말이다. 협의회는 그간 양국 교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삼 확인하고 공동 선교과제를 모색하는 뜻 깊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언제나 눈에 띄는 것은 낯선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이다. 협의회가 열렸던 대도시 토론토에는 마치 온 세계의 인류가 다 모여 있는 듯했다. 토론토의 경우 이미 소수 민족들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백인보다 많다고 하니 당연한 풍경이었다. 흔히 말하기를, 미국 사회를 ‘용광로’로 비유하고 캐나다 사회를 ‘모자이크’로 비유한다. 용광로가 서로 다른 인종을 완전히 뒤섞어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자이크는 각기 다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미국의 용광로는 실상 끓는 용광로가 아니라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모자이크는 각기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어울리는 진짜 모자이크라고들 한다. 토론토의 풍경은 과연 모자이크와 같았다. 동전을 달라고 차 앞으로 덤벼드는 백인 거지의 모습마저도 그 풍경에 일조를 했다.
협의회가 끝나고 탐방차 런던지방에 이르니 그 풍경은 전혀 달랐다. 한없이 드넓은 대지와 쭉쭉 뻗은 도로가 인상적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백인이었다. 풍요로운 땅에 사는 여유로운 백인들의 사회로 보였다. 풍요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탓일까? 물론 그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미국의 농산물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실이라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의 풍경은 풍요롭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발랄했다.
마침 연회가 열리고 있어 참석을 했는데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청년들은 별도의 포럼을 여는가 하면 총대로 참석을 했고, 어린이들도 학교를 빼먹고 캠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수이고, 물론 남녀의 비율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회무처리 중간 중간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고, 선교적 주제로 진지하게 공부도 했다. 엄숙한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한국에서의 노회나 총회 풍경에 익숙한 나에게 더욱 놀라운 것은 복장의 자유분방함이었다. 정장을 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자유로운 복장을 했다. 심지어 반바지를 입고 강단에 올라서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대도시 토론토에서 형형색색 인종의 모자이크를 보았다면, 시골지역 런던에서는 거의 백인 일색이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개인들의 형형색색 모자이크를 본 셈이었다.
‘순혈주의’에 익숙한 한국의 이방인에게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 사회의 풍경은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수십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국제결혼의 비율이 13%에 달하는 우리 사회 현실을 돌아볼 때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한 단면을 예시해주는 것 같았다.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형형색색 모자이크의 나라
별 재간은 없지만 그저 하는 일 하다 보니 바깥나라 나들이도 심심치 않다. 캐나다연합교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협의회차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달 말 캐나다를 방문했다. “제국 상황에서의 선교”라는 무거운 주제발표 과제를 안고서 말이다. 협의회는 그간 양국 교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삼 확인하고 공동 선교과제를 모색하는 뜻 깊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언제나 눈에 띄는 것은 낯선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이다. 협의회가 열렸던 대도시 토론토에는 마치 온 세계의 인류가 다 모여 있는 듯했다. 토론토의 경우 이미 소수 민족들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백인보다 많다고 하니 당연한 풍경이었다. 흔히 말하기를, 미국 사회를 ‘용광로’로 비유하고 캐나다 사회를 ‘모자이크’로 비유한다. 용광로가 서로 다른 인종을 완전히 뒤섞어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모자이크는 각기 다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미국의 용광로는 실상 끓는 용광로가 아니라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모양을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모자이크는 각기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어울리는 진짜 모자이크라고들 한다. 토론토의 풍경은 과연 모자이크와 같았다. 동전을 달라고 차 앞으로 덤벼드는 백인 거지의 모습마저도 그 풍경에 일조를 했다.
협의회가 끝나고 탐방차 런던지방에 이르니 그 풍경은 전혀 달랐다. 한없이 드넓은 대지와 쭉쭉 뻗은 도로가 인상적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백인이었다. 풍요로운 땅에 사는 여유로운 백인들의 사회로 보였다. 풍요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탓일까? 물론 그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미국의 농산물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실이라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농촌과 지방 소도시의 풍경은 풍요롭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 때문인지 사람들은 발랄했다.
마침 연회가 열리고 있어 참석을 했는데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청년들은 별도의 포럼을 여는가 하면 총대로 참석을 했고, 어린이들도 학교를 빼먹고 캠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수이고, 물론 남녀의 비율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회무처리 중간 중간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았고, 선교적 주제로 진지하게 공부도 했다. 엄숙한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한국에서의 노회나 총회 풍경에 익숙한 나에게 더욱 놀라운 것은 복장의 자유분방함이었다. 정장을 한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자유로운 복장을 했다. 심지어 반바지를 입고 강단에 올라서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대도시 토론토에서 형형색색 인종의 모자이크를 보았다면, 시골지역 런던에서는 거의 백인 일색이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개인들의 형형색색 모자이크를 본 셈이었다.
‘순혈주의’에 익숙한 한국의 이방인에게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 사회의 풍경은 낯선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수십만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국제결혼의 비율이 13%에 달하는 우리 사회 현실을 돌아볼 때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한 단면을 예시해주는 것 같았다.

최형묵 / 천안살림교회 목사 / http://www.salrim.net/
전체 0개